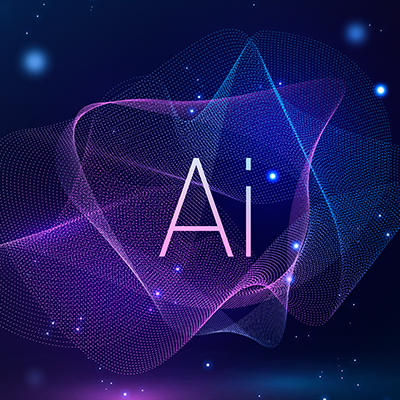과학적 지식은 사람이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에 크게 영향을 준다. 과거 우리 몸속의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을 때와 비교하여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알려진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진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한다. 하늘 너머 우주가 어떤 모습일지 몰랐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식은 관점과 개념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
이 우주는 사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별은 모래알보다 작은 것이라고 한다. 지구별은 우주 어디엔가 떠 있고, 빙글빙글 돌고 있으며, 태양을 돌고 있다. 태양 또한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실상 나선형 모양으로 막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지구별의 표면에 발을 붙이고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천만 년, 몇 억 년의 시간의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때 내가 늘 봐 왔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했었다.
나는 속이 꽉 차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자기 전의 내가 오늘 일어나서의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이 먹은 음식에 의하여 조금씩 대체되고 3개월이면 대부분 대체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대체된다. 나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내 피부, 내 뼈, 내 손, 내 살, 내 몸이 3개월동안 먹은 사과, 밥, 국밥, 이런 걸로 대체된다고. 그리고 이전에 먹은 것은 희미해져 가고, 새롭게 먹은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그러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몸의 구성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임을 유지시켜 주는 어떤 질서, 알고리즘, 즉 어떤 틀(template)이라 할 수 있겠다.
틀은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이다. 그럼 이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DNA에 들어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DNA로부터 발생하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섭취된 콩나물의 어떤 분자는 내 몸 어딘가의 분자를 대체하고, 우유의 단백질 분자는 그동안 수고한 몸 어딘가의 단백질 분자를 대체하는 등의 일을 할 것이다. 어제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은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같은 본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운영체제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나로써 유지되는 기능은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있으며, 가동되는 순간 비로소 결과로써 실체가 드러나는 매우 다이나믹한 속성을 가졌다 하겠다.
인공지능을 향한 접근방법을 만들어 가던 초기에는 지능을 정의하고 지능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찾아야 했다. 지능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지식기반 시스템, 즉 Rule-based 시스템으로 향하게 되었다.
사람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마치, 온도가 올라가면 보일러를 끄고, 온도가 내려가면 보일러를 켠다는 단순한 규칙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기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규칙을 많이 알면 더욱 똑똑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수많은 rule과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컴퓨터를 위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을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추상화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맥락을 놓치기가 쉬웠다. Rule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만들 때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이 ‘표현’을 만들어야 한다. 사과를 사과라고 하고, 의자를 의자라고 하듯이 대상을 놓고 그것을 말로 써 내야 하는 것이다. 사과 실물을 보고 ‘사과’라고 쓰는 것은 쉽지만, 내가 일생에 걸쳐 가지고 있는 사과에 대한 그 모든 경험은 글로 모두 써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식기반 시스템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의미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식기반 시스템은 좁은 영역에서는 잘 작동하며 컴퓨팅 환경 곳곳에 스며들어있다.
요즘의 인공지능에서는 사람의 신경망을 참고하여 만든 딥러닝에 의한 방법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챗GPT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인공지능이 그 연장선에 있다. 사람의 신경 하나 하나는 비교적 단순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수많은 신경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쓰는 인공 신경망은 수학 공식으로 떨어진다. 이 수학 공식을 컴퓨터에서 코딩하여 실행시키게 된다.
한편, 지식기반 시스템이나 딥러닝 시스템은 컴퓨터 속에서 계산만 하는 지능이다. 사람의 머리 안에서 실행되는 기능만 추려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컴퓨터에 넣었다. 몸이 없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지능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몸의 역할이 없을까? 우리 몸이 다르면 지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은 실제의 상황 속에서 지능이 세상과 물리적인 접점을 만드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라는 점이다.
인공지능에서 몸의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이 로보틱스이다. 로보틱스에서는 지능이 비로소 몸을 가지게 된다. 로봇의 모양, 재료와 같은 조형성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 로봇이 가진 지능의 일부가 된다 할 수 있다.
한 로봇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그것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몸체 구성과 구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행되는 지능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추상적인 의미를 다루는 ‘마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어느 정도 호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에 있어서나, 사람에 있어서나, 마음과 몸의 경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나아가서 로봇은 세상 속에 놓여있다. 장소특정미술에서 장소성이 작품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처럼, 로봇 또한 장소 의존적이다. 로봇의 지능적 프로그램은 바디를 통하여 구사되고 로봇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역량이 ‘발휘’된다 보는 것이다 (‘Intelligence Without Reason’, Rodney Brooks, 1991). 지능의 떠 있는 이러한 속성은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앞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뒤샹은 ‘관객이 작품을 완성한다’ 라는 관점을 제시하여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관객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작가가 하는 일은 관객이 작품을 완성해 가기 위한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Untitled 5’(Camille Utterback, 2005) 같은 작품처럼 관객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는 작품들에서 작가는 관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한다. 작가의 알고리즘은 공중에 떠 있고 관객이 그 템플릿을 실현시키면서 변화무쌍한 작품을 만들어 간다.
뒤샹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고, 인공지능은 20세기 중반에 생겨나 자리를 잡아왔다. 뒤샹이 보았던 것을 소수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보았더라면 인공지능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행운일지 모른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